“끝없는 평원에서 답을 찾다”
컬처 브랜딩 에이전시 ‘스튜디오 세렝게티’ 정구헌 대표·천중근 CP·정아연 CP 인터뷰
공공과 브랜드, 공연과 전시, 오프라인과 디지털.
이질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하나의 언어로 엮어내는 컬처 브랜딩 에이전시 스튜디오 세렝게티는 비교적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21년 4월 설립 이후 공연 콘텐츠 중심의 공공 프로젝트와 브랜드 경험 설계를 병행하며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에는 스튜디오 세렝게티의 정구헌 대표, 천중근 CP, 정아연 CP가 함께 자리했다.
메가 이벤트의 현장에서, 창업으로 이어진 여정
정구헌 대표의 커리어는 국내 굵직한 메가 이벤트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2012년에 QSCOM(큐스컴)에 입사해서 약 4~5년 정도 근무했고, 이후 CJ E&M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3년, 그리고 모츠에서 약 3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아시안게임, 광주 유니버시아드, FIFA U-20 월드컵,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진다. 한국 메가 이벤트 현장을 두루 경험한 셈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메가 이벤트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고, 이후 컬처 브랜딩이라는 방향으로 스튜디오 세렝게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브랜드와 전시, 현장을 읽는 CP의 시선
천중근 CP는 전시·이벤트 업계에서 12년 가까이 활동해 온 베테랑이다. 특히 브랜드 전시 경험이 풍부하다.
“2014년부터 전시 일을 시작했고, 주로 브랜드 중심 회사에서 모터쇼를 많이 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를 2~3년 정도 담당했죠.”
그는 공공과 브랜드 프로젝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공공은 명확한 기준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브랜드는 더 컨셉추얼하고 기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느 한쪽이 더 좋다기보다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는 브랜드 전시와 공공 항공 시연 프로젝트를 꼽았다.
“스메그 브랜드 전시는 레퍼런스를 ‘있는 그대로’ 구현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고, 공공에서는 UAM 비행 시연처럼 ‘안 될 것 같은 걸 되게 만든’ 기억이 특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된 감각
정아연 CP는 디지털 마케팅 출신이다. 스튜디오 세렝게티 합류 전까지 브랜드 디지털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을 주로 담당했다.
“올리브영 올영세일 캠페인이나 브랜드 영상 콘텐츠를 오래 진행했어요. KPI 달성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캠페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가 느끼는 디지털 마케팅의 보람은 ‘즉각적인 반응’이다.
“소셜 캠페인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때 ‘타겟을 잘 읽었구나’, ‘콘텐츠를 잘 만들었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현재 그는 회사의 디지털 홍보, 인스타그램 운영, 디지털 매거진, BTL 사업까지 폭넓게 담당하며 오프라인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 중이다.
“디지털에서 느끼던 반응을 이제는 현장에서,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자 재미입니다.”
오사카 엑스포에서 확인한 ‘경험 설계’의 힘
세 사람 모두 공통의 인상 깊은 경험으로 오사카 엑스포를 꼽았다. 회사 워크숍으로 방문한 현장에서 각국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직접 체험했다.
“각 나라가 자국의 강점을 관람객이 ‘체험’하도록 풀어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독일관은 환경, 기술, 국가적 자부심을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녹여냈죠.”
이는 스튜디오 세렝게티가 지향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한 전시나 이벤트가 아니라, 관람객이 체감하고 기억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
7대 3, 공공과 브랜드의 균형
현재 스튜디오 세렝게티의 프로젝트 비중은 공공 70%, 브랜드 30% 정도다. 서로 다른 영역을 병행하는 데 대한 어려움은 없을까.
“공공도 공연 콘텐츠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쌓였고, 브랜드는 이전 회사에서부터 해오던 영역이라 큰 이질감은 없습니다.”
천중근 CP 역시 “둘 중 하나를 가리지 않는다”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뿐이라고 말한다.
‘세렝게티’라는 이름에 담긴 기억
회사명 ‘세렝게티’는 스와힐리어로 ‘끝없는 평원’을 뜻한다.
“한 번 들으면 잘 잊히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제 20대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축구팀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재밌었던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세렝게티’라는 이름만으로도 회사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수평적인 문화, 그리고 책임감
두 CP가 공통으로 꼽은 회사의 장점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다.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 그걸 열린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수평적인 구조가 오히려 더 프로페셔널한 책임감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업의 매력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묻자, 정구헌 대표는 짧지만 인상적인 답을 내놓았다.
“저희끼리 농담처럼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말해요.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 그래서 힘들어도 현장에 서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아연 CP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만들 때는 힘들지만, 현장에서 관객 반응을 직접 느끼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이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공공과 브랜드, 디지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스튜디오 세렝게티.
‘끝없는 평원’이라는 이름처럼, 이들의 다음 행보 역시 어디까지 확장될지 궁금해진다.
 엄상용님의 최근 글
엄상용님의 최근 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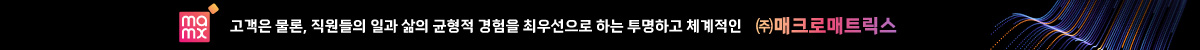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