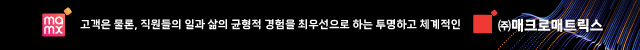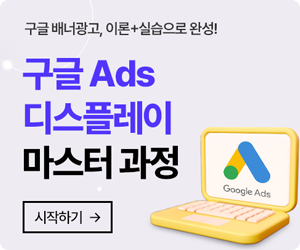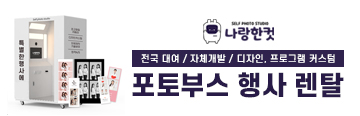행사 전문 감독제, 필요하다 없다~
최근 서울시청의 전문 감독제가 논란의 중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측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회계법”에 있어 감독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준비를 위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행사를 하는데 대행업체 선정을 3월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입찰 업체 선정 이전에 여러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감독제가 필요합니다. 즉 미리미리 업무를 추진해야 하니까요.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음악제, 예술제, 미술제, 전통음악제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벤트기획자가 행사기획 및 연출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감독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이벤트회사의 수익저하가 그 원인입니다. 이벤트회사를 비롯하여 모든 회사의 목적은 수익창출입니다. 즉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그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제가 가져오는 폐단중의 하나가 바로 수익저하입니다. 음향, 조명 등 시스템 혹은 기자재에 있어 본인과의 연관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연출과 운영을 위해서는 감독과 잘 통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얘기안해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이벤트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행사주최자, 소위 광고주라고 하는 사람들 설득하기도 벅찬데 감독이라는 존재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더욱이 감독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데 이벤트회사의 존재는 뭐가 되는지요? 그저 용역업체에 불과한 일을 하려니 자존심도 무척 상합니다. 기획사라기보다는 단순 운영업체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권한은 감독에게 주고 이행보증을 통해 책임은 이벤트회사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모 씨의 지적도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정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독의 경우에는 그저 주최자측에서 지급한 감독료만 받고 일을 합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을 지키고 대행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윈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전문감독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여 정착을 시킬지...
감독은 이벤트 회사를 무시하고 이벤트회사도 감독을 무시하고 욕한다면 이 제도는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 이벤트 산업을 위한 감독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문코너(첫 화면 우측 하단)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벤트넷님의 최근 글
이벤트넷님의 최근 글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